동굴에 들어가려면 헤드랜턴과 헬멧과 친구. 이 세 개가 필요하다.

동굴은 수백년, 수천년에 걸쳐 뚝뚝 떨어진 빗물이 만든다. 빗물은 약산성이다. 공기 중에 퍼진 이산화탄소를 머금기 때문이다. 빗물은 석회암을 녹여 틈을 만들고 그게 계속 반복돼 점점 넓어지면 통로가 된다. 다시 그 통로를 타고 물이 떨어지면서 천장과 바닥에 길을 만든다. 막혀있기도 하고 뚫려있기도 한 길.
동굴 길은 계속 이어진다. 천장과 바닥에 쌓인 시간을 랜턴으로 비춰도 비슷한 곳에서 계속 길을 잃는다. 나가야하는데. 헬멧에 물이 떨어진다. 공명. 괜히 아! 하고 소리지른다.

작년 겨울, 사람들에게 소설쓰기에 참여하기를 권했다. 처음엔 같이 놀려고 시작했다. 난 동굴, 호수, 빙하, 화산을 보기 위한 여행 중이었다. 좋은 종이가 마땅히 없어서 전자항공권을 출력한 종이를 길게 잘라 집게로 집어 빈 책을 만들었다. 표지에 ‘앞선 문장을 읽고 이어서 한 문장을 써주세요’라고 적어서 사람들에게 내밀었다. 편의상 영어를 선택했다.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 참여했고 번역기를 돌려 영어로 써주기도 했다. 화가, 전시기획자, 미술관직원, 순찰대원, 마사지사, 운동센터 강사, 엔지니어, 마트 직원, 트럭기사, 그냥 정말 모르는사람, 언젠가 한 공간에 있었던 사람. 들에게 부탁했다. 그들의 다양한 글씨도 있다.

사람들은 글을 뚝뚝 떨어뜨렸다. 그리고 나는 그걸 들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글을 뚝뚝 떨어뜨리길 청했다.
사람들은 내 예상을 철저히 빗나갔다. 매번 혼란에 빠진 글을 돌려받고도 그대로 두고봐야 했다. 왜 더 특별한 내용이 되지 않는거지? 나라면 이런 문장을 썼을텐데! 없던일로 하고 소설2를 시작할까? 아님 이미 썼던 사람이 한번 더 쓰게 할까? 어차피 아무도 모르니까 내가 한문장을 더 쓸까? 난 이 소설을 통제할 수 없으면서도 통제하고 싶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면서 무언가를 원했다. 그러나 이 혼란을 견디기로 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 계속해보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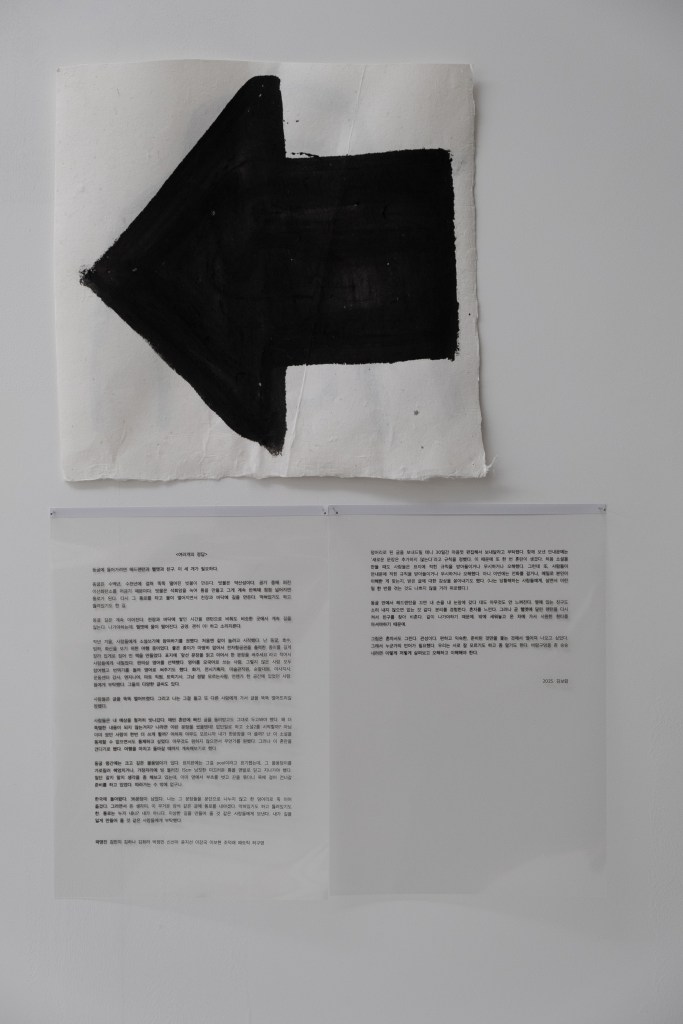
동굴 중간에는 크고 깊은 물웅덩이가 있다. 표지판에는 그걸 pool이라고 표기했는데, 그 물웅덩이를 가로질러 헤엄치거나, 가장자리에 빙 둘러진 15cm 남짓한 미끄러운 틈을 맨발로 딛고 지나가야 했다. 일단 갈지 말지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 이미 옆에서 부츠를 벗고 끈을 묶더니 목에 걸어 건너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따라가는 수 밖에 없구나.

한국에 돌아왔다. 36문장이 남았다. 나는 그 문장들을 문단으로 나누지 않고 한 덩어리로 죽 이어 옮겼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이 무거운 암석 같은 글에 통로를 내야겠다. 막혀있기도 하고 뚫려있기도 한. 통로는 누가 내나? 내가 아니다. 이상한 길을 만들어 줄 것 같은 사람들에게 보낸다. 내가 길을 잃게 만들어 줄 것 같은 사람들에게 부탁했다.
곽영진 김민지 김하나 김희라 박정민 신선아 윤지선 이강국 이보현 조덕래 패트릭 허구영
덩어리로 된 글을 보내드릴 테니 30일간 마음껏 편집해서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함께 보낸 안내문에는 ‘새로운 문장은 추가하지 않는다’라고 규칙을 정했다. 이 때문에 또 한 번 혼란이 생겼다. 처음 소설을 만들 때도 사람들은 표지에 적힌 규칙을 받아들이거나 무시하거나 오해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이 안내문에 적힌 규칙을 받아들이거나 무시하거나 오해했다. 아니 이번에는 전화를 걸거나, 메일로 본인이 이해한 게 맞는지, 받은 글에 대한 감상을 쏟아내기도 했다. (나는 당황해하는 사람들에게, 살면서 이런 일 한 번쯤 겪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위로했다.)

동굴 안에서 헤드랜턴을 끄면 내 손을 내 눈앞에 갖다 대도 아무것도 안 느껴진다. 옆에 있는 친구도 소리 내지 않으면 없는 것 같다. 분리를 경험한다. 혼자를 느낀다. 그러나 곧 헬멧에 달린 랜턴을 다시 켜서 친구를 찾아 비춘다. 같이 나가야하기 때문에. 밖에 세워놓고 온 차에 가서 시원한 환타를 마셔야하기 때문에.

그림은 혼자서도 그린다. 관성이다. 편하고 익숙한, 준비된 것만을 좇는 것에서 떨어져 나오고 싶었다. 그래서 누군가의 언어가 필요했다. 우리는 서로 잘 모르기도 하고 좀 알기도 한다. 바람구멍을 좀 숭숭 내려면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고 오해하고 이해해야 한다.
2025. 김보람
댓글 남기기